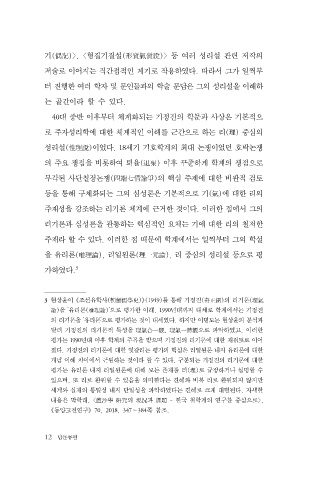Page 12 - 답문류편
P. 12
기(偶記)〉, 〈형질기질설(形質氣質說)〉 등 여러 성리설 관련 저작의
저술로 이어지는 직간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그가 일찍부
터 진행한 여러 학자 및 문인들과의 학술 문답은 그의 성리설을 이해하
는 골간이라 할 수 있다.
40대 중반 이후부터 체계화되는 기정진의 학문과 사상은 기본적으
로 주자성리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근간으로 하는 리(理) 중심의
성리설(性理說)이었다. 18세기 기호학계의 최대 논쟁이었던 호락논쟁
의 주요 쟁점을 비롯하여 퇴율(退栗) 이후 꾸준하게 학계의 쟁점으로
부각된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의 핵심 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을 통해 구체화되는 그의 심성론은 기본적으로 기(氣)에 대한 리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리기론 체계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리기론과 심성론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체는 기에 대한 리의 철저한
주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그의 학설
을 유리론(唯理論), 리일원론(理一元論), 리 중심의 성리설 등으로 평
가하였다.
현상윤이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1949)를 통해 기정진(奇正鎭)의 리기론(理氣
論)을 ‘유리론(唯理論)’으로 평가한 이래, 1990년대까지 대체로 학계에서는 기정진
의 리기론을 ‘유리론’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세였다. 하지만 이병도는 현상윤의 분석과
달리 기정진의 리기론적 특성을 理氣合一觀, 理氣一體觀으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1990년대 이후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기정진의 리기론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
졌다. 기정진의 리기론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의 핵심은 리일원론 내지 유리론에 대한
개념 이해 차이에서 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분되는 기정진의 리기론에 대한
평가는 유리론 내지 리일원론에 대해 모든 존재를 리(理)로 규정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며, 또 리로 환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비록 리로 환원되지 않지만
세계와 실재의 통일성 내지 단일성을 파악하였다는 견해로 크게 대별된다. 자세한
내용은 박학래, 〈蘆沙學 硏究의 現況과 課題 - 한국 철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0, 2018, 347~384쪽 참조.
12 답문류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