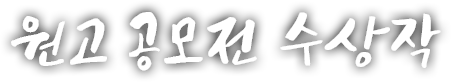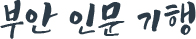[원고 공모전 수상작] 부안 인문 기행 게시기간 : 2025-07-09 07:00부터 2030-12-17 21:21까지 등록일 : 2025-07-02 15:51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원고 공모전 수상작
|
||||||||
|
1. 머리말 부안이다. 이름만 들어도 까닭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안이다. 편안하다는 뜻의 ‘안(安)1)’ 자가 들어가서 그러한 것일까? ‘부안(扶安)’ 하면 사람들은 단연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부안에는 해안 지형의 자연미가 가장 뛰어난 채석강과 적벽강, 웅장한 폭포와 여러 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의 풍광이 아름다운 직소폭포와 독특한 지형적 특성은 물론 우금산성과 개암사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집약된 우금바위 등 수많은 명승이 곳곳에 있다. 무려 세 곳의 명승 명승2)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호남의 부안이다. 나는 몇 해 전 변산반도의 해안 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8코스의 변산 마실길을 걷기 위해 부안으로 향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듯이, 걸어야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안을 두 발로 직접 걸으며 보고 듣고 느끼고 싶었다. 몸집만 한 배낭을 둘러메고 부안을 걸었다. 직접 걸으면서 마주한 부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매력적이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부안은 걷는 내내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더위를 느낄 새도 없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상쾌한 기분’이라는 꽃말을 가진 금계국 군락도 지났다. 변산마실길을 걸으며 문득 부안의 옛길이 궁금해졌다. 이처럼 아름다운 풍광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길 위를 걸었던 옛사람들의 시선이 궁금해졌다. 변산마실길 트레킹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가면 조선시대 부안 지역을 유람했던 사람들의 글을 꼭 찾아보아야겠노라 생각하고 발걸음을 뗐다. 부안 시내에서 줄포면으로 이동하여 곰소항 터미널에서부터 모항마을과 격포항을 지나 변산해수욕장에서 일정을 마쳤다. 총거리는 약 40km, 3박 4일 동안의 여정이었다. 그 뒤로도 종종 부안을 찾았다. 개암사와 내소사에서 고즈넉한 정취를 느끼기도 하고, 내변산 구석구석을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였다. 누군가 부안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팔을 걷고 나서며 ‘지금은 여기를 꼭 가야해!’라며 열변을 토하곤 했다. 2. 과거와 현재를 잇는 걷기 여행 서울로 돌아온 뒤, 새까맣게 부안을 잊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한 폭의 그림을 보고 다시금 부안에 가야겠노라 생각했다. 그 그림은 바로 조선 후기 시(詩)·서(書)·화(畵)에 뛰어나 삼절(三絶)의 예술가로 일컬어진 표암 강세황(姜世晃)이 1770년(영조 46) 5월에 부안 일대를 유람하고 그린 실경산수화 「부안유람도권(扶安遊覽圖卷)」이었다. 이 작품은 18세기 부안 일대를 그린 유일한 산수화로 알려져 있다.
강세황(姜世晃)은 부안 현감으로 재직 중이었던 둘째 아들 강흔을 찾아와 부안 읍성에서 출발해 개암사와 옥천암 등 우금바위 일원을 유람하고, 실상사와 용추, 내소사 등을 지나 채석강과 격포진 일대까지 두루 둘러보았다. 이처럼 조선시대 문인들은 부안을 유람하고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16세기에는 이정귀(李廷龜)와 승려 인오(印悟)가 부안을 유람하였고, 17세기에는 심광세(沈光世)와 이세환(李世煥) 등이, 18세기에는 이기경(李基慶), 김수민(金壽民), 강세황 등 수많은 문인 학자들이 이 지역을 유람하였다. 이들은 실상사, 직소폭포, 우금암, 개암사, 월명암, 내소사 등 오늘날까지도 부안의 대표 명승으로 꼽히는 장소를 빠짐없이 찾았고, 유람록과 시문을 통해 그 감회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19세기에는 초은 신관렬(辛觀烈), 송병선(宋秉璿), 이헌영(李𨯶永), 소승규(蘇昇奎) 등이 유람 기록을 남기며 부안을 ‘소봉래(小蓬萊)3)’로 부르며 그 경치를 예찬하였다. (1) 국내에서 이름났고 세상에서는 소봉래라고 일컫는데, 동봉과 월사가 모두 금강산이나 지리산과 으뜸을 다툰다고 하였다. 내가 일찍부터 보고 싶었다.4)
(2) 내가 일찍이 듣건대, 호남의 우측에 있는 부풍현에 바다와 명산이 있으니 ‘소봉래’라고 한다. 일찍이 본도의 수령과 벼슬아치들이 모두 다녀왔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관리와 문인들이 또한 많이들 이곳을 방문하였다.5) 인용문 (1)은 송병선이 부안을 유람하고 싶었던 이유를 밝힌 대목이다. 유람 동기 첫 번째는 국내에서 소봉래로 일컬어질 만큼 이름이 났다는 것이다. 비록 16세기부터 시작된 부안 유람은 기록의 분량으로 보면 금강산과 지리산, 묘향산 유산기보다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부안은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아름답기로 이름이 났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김시습과 이정귀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산수의 자연경관에 뛰어난 감식안을 지닌 김시습의 행적은 물론, 그런 김시습의 영향으로 변산을 유람했던 이정귀의 기록이 부안을 유람하도록 이끈 것이다. 인용문 (2)에서는 부안이 전국에 ‘소봉래’로 명성을 떨쳤다는 근거로 우리나라의 관리와 문인들이 이곳을 많이 찾았음을 말해준다. 그는 바쁜 업무로 겨를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추천과 권유로 변산 일대를 유람하게 된 것이다. 부안의 변산은 18세기를 지나오며 변산을 중심으로 여러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소봉래(小蓬萊)’의 지위를 획득했음을 알 수 있다.7) 나는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시인이나 문인들이 남긴 글을 손에 들고, 그들의 눈으로 부안을 보기 위해서였다. 배낭을 짊어지고 한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다시 남쪽으로 향했다. 3. 19세기 부안 현지인 초은 신관렬이 바라본 부안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이 산수와 명당에 대해 저술한 인문지리서 『택리지(擇里志)』에서 부안의 자연경관과 주거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부안의 변산 부근과 흥덕의 장지 아래는 토지가 비옥하고 호수와 산의 경관도 아름답다. 이들 지역 가운데 샘물에 장기가 없는 땅은 살기에 적합하다.”7)
이중환의 이 평가는 당시 지리학과 명당론의 관점에서 부안이 얼마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순히 풍광이 아름답다는 차원을 넘어, '샘물에 장기가 없다'는 표현을 통해 부안이 질병의 기운이 적고 수질이 맑은 건강한 거주지임을 시사하였다. ‘호산지경(湖山之景)’이라는 구절에서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명승지의 경관이 부안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단지 유람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로서도 부안이 매우 적합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부안을 유람한 많은 문인과 시인들의 기록에서도 반복되며, 부안이 가진 자연미와 생태적 안정성, 인문학적 매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안의 땅에서 나고 자란 현지인의 시선은 어떠했을까. 1849년 부안군 내변산 봉래산 기슭의 촌가에서 태어난 초은(樵隱) 신관렬(辛觀烈)의 작품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어려서 백부(伯父)인 하석(霞石) 신동직(辛東稷)에게 수학하였으며, 평생 공직에 나가지 않고, 청림마을 초야에서 경사(經史)를 연구하며, 독서하고, 시문을 저술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한편으로는 부안의 유림과 시계(詩契)를 맺고 부안의 경승지를 탐방하며 시문을 화답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신관렬의 문집 『초은유고(樵隱遺稿)』의 권1에 부안의 명승을 탐방하며 지은 기행시가 매우 많다. 부안의 명소인 검모포, 내소사, 영은사, 용각대, 용추, 만하루, 가마소, 사자암, 서림정, 실상사, 쌍선봉, 와룡소, 우금암, 운정, 웅연, 원효암, 월명암, 월정대, 청련암, 토끼섬, 호안 등을 직접 탐방하며 지은 작품들이다. 다음 작품은 내변산 직소폭포 아래 형성된 직소 용추(龍湫)를 배경으로 한다. 가파른 절벽과 깊은 호수는 푸른데 / 絕壁深湫碧
바라보면 정신이 아찔한 듯하네 / 望之若眩神 용이 있다면 마땅히 이곳에 거처하고 있어 / 有龍當宅此 비를 불러 백성들을 이롭게 해주리라 / 興雨利生民 용추는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에 있는 직소폭포(直沼瀑布)의 물웅덩이 변산팔경(邊山八景) 중 하나이며, 내변산 제일경(第一景)으로 인정받고 있다. 폭포 아래 형성된 직소를 예전에는 내변산의 사찰인 실상사(實相寺)의 이름을 따서 실상용추(實相龍湫)라고 불렀다. 1932년 간행된 부안군지 부풍승람(扶風勝覽)에 의하면, 직소에 기우단(祈雨壇)이 있었다고 전한다. 초은은 절벽의 높이와 용추의 심연을 ‘현신(眩神)’, 즉 정신이 아찔할 만큼 깊고 신비한 공간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묘사를 넘어서, 용이 거처할 만한 영험한 장소로 직소를 인식한 것이다. 마지막 구절은 용이 비를 내려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민간 신앙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연과 민생을 잇는 유학자의 시선을 보여준다. 초은은 내변산 청림마을 출신의 유학자이자 시인이며, 평생을 고향 부안에서 보냈다. 그에게 용추는 명소이자 삶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하늘 밖의 석문관으로 / 天外石門關
물줄기가 이곳을 휩쓸어 가네 / 衆流漰此間 창연히 와룡이 있는데 / 蒼然臥龍在 변하여 산에 숨어 전하네 / 變化故藏山 와룡소(卧龍沼)는 전북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에 있는 못으로, 용이 누워 있는 모습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초은은 이 시에서 용이 은거하는 신비한 지형을 천상의 관문(石門關)처럼 묘사하며, 물의 흐름과 지세의 조화를 묘파하고 있다. ‘변하여 산에 숨어 전하네〔變化故藏山.〕’는 마지막 구절은 용의 존재가 형체를 바꾸어 자연 속에 은거한다는 사유를 담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 인간, 신성함과 숭고함이 결합된 풍경 인식을 드러낸다. 그의 시는 단지 경치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연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지역의 기억을 보존하는 문학적 행위이자 인문 지리적 실천이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초은의 시를 다시 읽고,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곧 부안이라는 지역의 유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4. 맺음말 조선시대 유람 기록과 기행시를 따라 ‘지역’을 걷는 것은 해당 공간에 새겨진 유람의 전통과 자연에 깃든 철학적 성찰, 지역과 인간의 교감을 되짚는 일이자 고전과 현재를 잇는 작고도 의미 있는 실천이다. 이에 본 에세이에서는 부안이라는 지역을 유람한 조선 후기의 일화를 소개하며,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강세황이 화폭에 담고 신관렬이 시로 노래했던 부안의 자연과 그 속에 깃든 인문 정신을 따라 걷는 경험은 부안을 관광지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지역성과 인문성, 공공성과 활용 가능성을 함께 갖춘 이 유산을 토대로, 더 많은 이들이 부안의 길 위에서 시를 읽고 자연을 사유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는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호남학’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여정이 될 것이다. 1) 안(安): 집 면(宀)자와 여자 여(女)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편안하다’,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2) 명승 : 일반적으로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이라고 정의한다. 3) 소봉래(小蓬萊) : 봉래산(蓬萊山)은 신선이 산다는 전설상의 산으로, 신선들이 살고 불로초(不老草)가 자란다는 이상향이자 신비로운 산을 뜻한다. 실제 지형이라기보다는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경치를 비유할 때 흔히 사용된다. 소봉래는 ‘작은 봉래산’이라는 의미로, 봉래산에 버금갈 정도로 아름답고 빼어난 경치를 가진 곳을 지칭할 때 쓰인다. 따라서 부안을 소봉래라고 부른 것은 부안의 경치가 마치 신선이 살 것 같은 신비롭고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극찬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宋秉璿, 『淵齋集』 卷21 「邊山記」, “名於國中. 世稱小蓬萊. 東峯月沙, 皆以金剛智異論甲乙, 余嘗願見.” 5) 李𨯶永, 『敬窩集略』 「扶風集略」 夏 「蓬山勝覽記」, “余嘗聞湖南之右扶風縣, 有邊海名山而名之以小蓬萊云矣. 曾經本道道伯及縣宰, 無不臨遊焉, 京國朝士及文人, 亦多尋過焉, 第其形勝之擅, 皆有一見之願. 6) 김광명, 「조선시대 부안 유람 기록에 관한 일고찰」, 『동양고전연구』 89집, 동양고전학회, 2022. 7) 惟扶安邊山之傍, 興德長池之下, 土地旣沃, 又有湖山之景, 槩就其中, 若擇無瘴泉處, 則此可以居止.” 『擇里志』 「八道論·全羅道」 집필자 김광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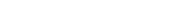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